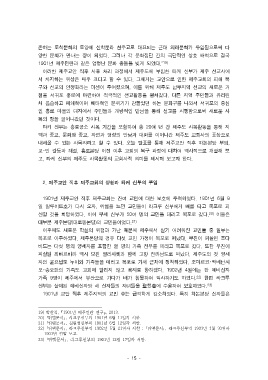Page 23 - taquet_symposium
P. 23
존하는 토착문화의 토양에 신학문과 천주교로 대표되는 근대 외래문화가 유입됨으로써 다
양한 문화가 만나는 장이 되었다. 그러나 각 문화집단 간의 극단적인 상호 배척으로 결국
1901년 제주민란과 같은 엄청난 문화 충돌을 빚게 되었다.” 19)
이러한 제주교안 직후 사후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에 부임한 타케 신부가 제주 선교사에
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교안으로 인한 제주교회의 피해 복
구와 선교의 안정화라는 미션이 주어졌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 남부지역 선교의 새로운 거
점을 서귀포 홍로에 마련하여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쳐갔다. 다른 지역 주민들과 유리된
채 음습하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던 하논 분화구를 나와서 서귀포의 중심
인 홍로 마을의 대지에서 주민들과 개방적인 만남을 통해 선교를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사
목의 장을 열어나갔던 것이다.
타케 신부는 홍로공소 사목 기간을 포함하여 총 20여 년 간 제주도 사목활동을 통해 지
역과 종교, 문화와 종교, 자연과 영성의 만남과 대화를 이어나간 제주도 교회사의 표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목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제주교안 직후 하논본당 부임,
교・민 갈등과 해결, 홍로본당 이전 이후 교회의 복구 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개괄해 보
고, 타케 신부의 제주도 사목활동의 교회사적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제주교안 직후 제주교회의 상황과 타케 신부의 부임
1901년 제주교안 직후 제주교회는 잔여 교민에 대한 보호에 주력하였다. 1901년 6월 9
일 알루이트호가 다시 오자, 위협을 느낀 교민들이 라크루 신부에게 배를 타고 목포로 피
20)
신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무세 신부가 50여 명의 교민을 데리고 목포로 갔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본당(대로동본당)의 교민들이었다. 21)
이후에도 새로운 학살의 위험과 가난 때문에 제주에서 살기 어려워진 교민들 중 일부는
목포로 이주하였다. 제주본당의 경우 다섯 교민 가정이 목포로 떠났다. 부친이 피살된 조다
비드는 다섯 명의 영세자를 포함한 열 명의 가족 전부를 데리고 목포로 갔다. 또한 부친이
피살된 최바르바라 역시 모친 엘리사벳과 함께 고향 전라남도로 떠났다. 제주도의 첫 영세
자인 윤요셉도 누이와 가족들을 데리고 목포로 가서 근처에 정착하였다. 조마르코・박베난시
오・송요한의 가족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육지로 향하였다. 1902년 4월에는 한 예비신자
가족 9명이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익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라크루
22)
신부는 살해된 예비신자와 새 신자들의 자녀들을 聖嬰會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다. 23)
1901년 교안 직후 제주지역의 교민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하논본당 신자들은
19)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 연구, 2013.
20) 「뮈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6월 11일자 서한.
21) 「뮈텔문서」, 김원영신부의 1901년 6월 12일자 서한.
22) 「뮈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2년 5월 21일자 서한 ; 「뮈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3년 3월 30일자
1903년 연말 보고.
23) 「뮈텔문서」, 라크루신부의 1901년 12월 17일자 서한.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