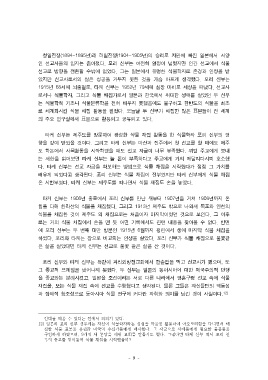Page 17 - taquet_symposium
P. 17
청일전쟁(1894~1895년)과 러일전쟁(1904~1905년)의 승리로 자만에 빠진 일본에서 서양
인 선교사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포리 신부는 여전히 열정이 넘쳤지만 인간 선교에서 식물
선교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로 존경과 인정을 받
았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포리 신부는
1915년 68세에 뇌출혈로, 타케 신부는 1952년 79세에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선교사
로서나 식물학자, 그리고 식물 채집가로서 일본과 한국에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두 신부
는 식물학적 기초나 식물분류학을 전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식물을 최초
로 체계화시킨 식물 채집 활동을 펼쳤다. 오늘날 두 신부가 채집한 많은 표본들이 전 세계
의 주요 연구실에서 표본으로 활용되고 공유되고 있다.
타케 신부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왕성한 식물 채집 활동을 한 식물학자 포리 신부의 영
향을 깊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타케 신부는 마산과 진주에서 첫 선교를 할 때에도 제주
도 하논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을 때도 선교 자금이 너무 부족했다. 뮈텔 주교에게 보내
는 서한을 읽어보면 타케 신부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주교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호소했
다. 타케 신부는 선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식물 채집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포리 신부는 식물 채집이 전부였지만 타케 신부에게 식물 채집
은 시한부였다. 타케 신부는 제주도를 떠나면서 식물 채집도 손을 놓았다.
타케 신부는 1906년 홍로에서 포리 신부를 만난 뒤부터 1907년을 거쳐 1908년까지 온
힘을 다해 한라산의 식물을 채집했다. 그리고 1913년 제주도 밖으로 나와서 목포와 인천의
식물을 채집한 것이 제주도 외 채집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로는 거의 식물 채집에서 손을 뗀 듯 어떤 기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에 포리 신부는 두 번째 대만 방문인 1915년 6월까지 펑린에서 생애 마지막 식물 채집을
하였다. 포리와 타케는 참으로 비교되는 인생을 살았다. 포리 신부가 식물 채집으로 불꽃같
은 삶을 살았다면 타케 신부는 선교로 풀꽃 같은 삶을 산 것이다.
포리 신부와 타케 신부는 똑같이 파리외방전교회에서 한솥밥을 먹고 선교사가 됐으며, 또
그 종교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두 신부는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만행
을 종교와는 분리시켰고, 일본을 조선이라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영혼구령 선교 속에 식물
채집을, 또는 식물 채집 속에 선교를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만의 역동성
과 잠재적 창조성으로 동아시아 식물 연구에 커다란 자취와 의미를 남긴 것이 사실이다. 12)
간대를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일본의 포리 신부 경우에는 자신이 식물학자라는 장점을 마음껏 활용하여 아오모리현을 다니면서 채
집한 식물 표본을 유럽과 미국의 수집가들에게 매각했다. 그 자금으로 사제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게 하였으며, 9개의 새 본당을 세워 교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타케 신부 역시 포리 신
부의 충고를 받아들여 식물 채집을 시작했을까?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