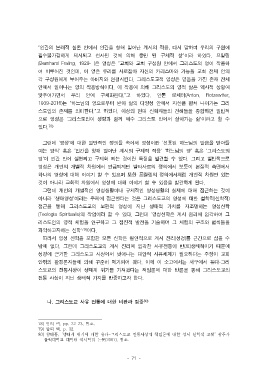Page 79 - taquet_symposium
P. 79
“인간의 본래적 실존 안에서 인간을 향해 일어난 계시의 적용, 다시 말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수불가결하게 제시되고 선사된 것에 의해 충만 된 구체적 삶”이라 하였다. 프랄링
(Bernhard Fraling, 1929- )은 영성은 “교회와 교회 구성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작용하
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영은 우리를 사로잡아 자신의 카리스마와 기능을 교회 전체 안의
각 구성원에게 부어주는 아버지와 연결시킨다. 그리스도교적 영성은 믿음을 가진 존재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작용방식이다. 이 작용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적 삶은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가면서 우리 안에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안톤 로체터(Anton. Rotzewtter,
1939-2016)는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받아 삶의 다양성 안에서 자신을 펼쳐 나아가는 그리
스도인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일반적
으로 영성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78)
있다.
그런데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들 속에서 영성이란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
이는 양식’ 혹은 ‘인간을 향해 일어난 계시의 구체적 적용’ ‘하느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안에 실현되고 구체화 되는 것이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성은 개인의 개별적 차원에서 언급되지만 발타사르의 정의에서 보듯이 본질적 측면에서
하나의 영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또한 프랄링의 정의에서처럼 개인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 영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의 개별적인 영성생활이나 구체적인 영성생활의 실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영성’이라는 주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성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접근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영성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영성신학
(Teologia Spiritualis)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성신학은 계시 원리에 입각하여 그
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연구하고 그 점진적 발전을 기술하며 그 체험의 구조와 법칙들을
79)
파악하고자하는 신학’ 이다.
따라서 영성 신학을 포함한 모든 신학은 필연적으로 계시 진리(성경)를 근간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계시 진리에 입각한 사유전통이 반(反)생태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벗어나는 대안적 사유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회
안팎의 환경론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소고에서는 서구에서 유다-그리
스도교의 전통사상이 생태계 위기를 가져왔다는 책임론에 대한 반론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전통 사상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반증하고자 한다.
나. 그리스도교 사유 전통에 대한 비판과 검증 80)
78) 앞의 책, pp. 22-23, 참조.
79) 앞의 책, p. 32.
80) 황태종, ‘생태계 위기에 대한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사상의 책임론에 대한 성서 신학적 고찰’ 광주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참조.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