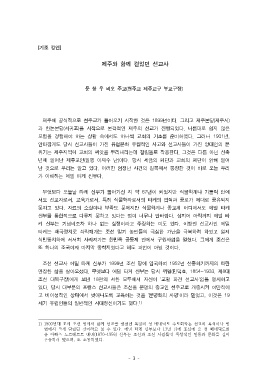Page 11 - taquet_symposium
P. 11
[기조 강연]
제주와 함께 걸었던 선교사
문 창 우 비오 주교(천주교 제주교구 부교구장)
제주에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99년이다. 그리고 제주본당(제주시)
과 한논본당(서귀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주의 선교가 진행되었다. 나름대로 쉽지 않은
모험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씩 교회의 기초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1901년,
안타깝게도 당시 선교사들이 가진 유럽문화 우월적인 사고와 선교사들이 가진 양대인의 분
위기는 제주지역에 교회의 씨앗을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축
년에 일어난 제주교안(일명 이재수 난)이다. 당시 세금의 폐단과 교회의 폐단이 얽혀 일어
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의 길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 이해하는 에밀 타케 신부다.
무엇보다 오늘날 타케 신부가 돌아가신 지 약 67년이 되었지만 식물학계나 가톨릭 안에
서도 선교자로서, 교육가로서, 특히 식물학자로서의 타케의 업적과 공로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의 소실이나 부족도 문제지만 식물학계나 종교계 어디에서도 에밀 타케
신부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심지어 아직까지 에밀 타
케 신부는 기념비조차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방인 선교사인 에밀
타케는 쇄국정치로 쇠락해가는 조선 말기 농민들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려 하였고 일제
식민통치하에 서서히 사라져가는 한민족 공동체 안에서 구원사업을 펼쳤다. 그에게 조선은
또 하나의 조국이자 마지막 종착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선 선교사 에밀 타케 신부가 1898년 조선 땅에 입국하여 1952년 선종하기까지의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 무엇보다 에밀 타케 신부는 당시 뮈텔(민덕효, 1854~1933, 제8대
조선 대목구장)에게 보낸 18편의 서한 모두에서 자신이 ‘교황 파견 선교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을 문명의 종교인 천주교로 개종시켜 야만적이
고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하는 것을 ‘문명화의 사명’이라 믿었고, 이것은 19
세기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시대정신이기도 했다. 1)
1) 1900년대 초에 조선 땅에서 함께 선교를 펼쳤던 독일의 성 베네딕도 수도회와는 선교의 목적이나 방
법에서 크게 달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밀 타케 신부보다 13년 뒤에 조선에 온 성 베네딕도회
총 아빠스 노르베르트 베버(1870~1956) 신부는 조선과 조선 사람들의 독창적인 전통과 문화를 깊이
존중하려 했으며, 또 소통하였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