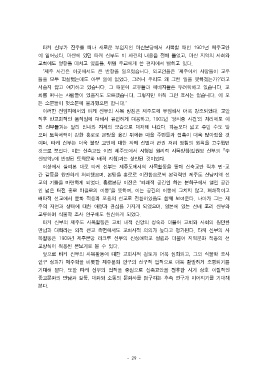Page 37 - taquet_symposium
P. 37
타케 신부가 진주를 떠나 새로운 부임지인 마산본당에서 사목할 때인 1901년 제주교안
이 일어났다. 마산에 있던 타케 신부도 이 사건의 내용을 전해 들었고, 마산 지역의 사회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뮈텔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제주 사건은 이곳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외교인들은 ‘제주에서 사람들이 교우
들을 모두 학살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도 왜 그런 일을 못하겠는가?’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우들과 예비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
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이 모
든 소문들이 헛소문에 불과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전임지에서의 타케 신부의 사목 방침은 제주도에 부임해서 더욱 강조되었다. 교안
직후 반교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1902년 ‘양시중 사건’의 처리에도 이
전 신부들과는 달리 인내와 자제의 모습으로 대처해 나갔다. 하논보다 넓고 주민 수도 많
으며 토착세력이 강한 홍로로 본당을 옮긴 뒤에는 마을 주민들과 접촉이 더욱 많아졌을 것
이며, 타케 신부는 더욱 불량 교민에 대한 자체 선별과 관권 처리 방침의 원칙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축교안 이전 제주도에서 시행된 원리적 사목방침(김원영 신부의 수
신영약에 반영된 토착문화 배격 지침)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타케 신부는 제주도에서의 사목활동을 통해 신축교안 직후 민・교
간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했으며, 본당을 홍로로 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도 산남지역 선
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홍로본당 이전은 “폐쇄적 공간인 하논 분화구에서 열린 공간
인 넓은 터전 홍로 마을로의 이동”을 뜻하며, 이는 공간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폐쇄적이고
배타적 선교에서 문화 적응과 포용의 선교로 전환하였음도 함께 보여준다. 나아가 그는 제
주의 자연과 생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에 있는 선배 포리 신부와
교류하며 식물학 조사 연구에도 헌신하게 되었다.
타케 신부의 제주도 사목활동은 교회 내적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교회와 사회의 원만한
만남과 대화라는 외적 선교 측면에서도 교회사적 의의가 높다고 평가된다. 타케 신부의 사
목활동은 1909년 제주본당 라크루 신부의 신성여학교 설립과 더불어 지역문화 적응의 선
교방식이 적용된 본보기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타케 신부의 사목활동에 대한 교회사적 검토가 더욱 심화되고, 그의 식물학 조사
연구 성과가 제주학을 비롯한 제주문화 연구의 선구적 업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조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타케 신부의 업적을 중심으로 신축교안을 전후한 시기 상호 이질적인
종교문화의 만남과 갈등, 대화와 소통의 문화사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29 -